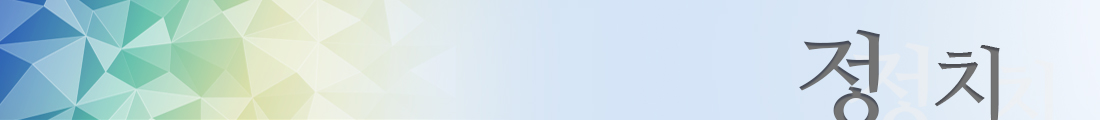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주도하는 인적청산이 친박(친박근혜)계 맏형 격인 서청원 의원의 저항으로 급격한 난기류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인 위원장은 자신이 제시한 탈당시한을 하루 앞둔 5일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숨 고르기에 들어간 듯한 모습을 보였다.
대신 인 위원장을 영입한 정우택 원내대표가 ‘마이크’를 잡았다. 정 원내대표는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비상 상황에서 누구보다 앞서 책임을 통감해야 할 일부 분들은 아직도 기득권에 연연하거나 당원들의 염원을 알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며 사실상 서 의원의 탈당을 ‘압박’했다.
전날 5선의 정갑윤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고, 이번 주말을 전후해 또 다른 몇몇 친박계 핵심 의원 역시 인 위원장에 탈당 의사를 표명하며 거취를 위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인 위원장을 필두로 당 지도부가 지원하고, 친박계 의원들까지 동조하며 서 의원을 비롯한 핵심 의원들을 포위해 들어가는 형국이다.
실제로 서 의원을 지지하는 일부 의원들이 인 위원장의 행태를 고발하기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정 원내대표는 이에 즉각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서는 인 위원장이 다른 친박계 의원들의 탈당계는 반려하고,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까지 3명을 ‘정밀 타격’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반면, 인적청산의 표적이 된 해당 의원들은 버티기에 들어갔다.
전날 인 위원장을 향해 날 선 비판을 가했던 서 의원은 이날 경기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핵심 당원들을 만나 최순실 사태 이후 당의 위기 속에서 결속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2선 후퇴’를 선언한 최경환 의원 역시 인 위원장의 탈당 압박에 개의치 않고 대구·경북 지역 신년 행사에 참석하며 당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충청권 출신인 인 위원장과 정 원내대표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영입을 위해 TK를 배제하려 한다는 반감이 강해 최 의원에 대한 지지세도 만만치 않은 분위기다.
친박계 핵심부는 인 위원장이 비대위나 윤리위를 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원들의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당분간 상태 추이를 지켜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 위원장이 윤리위를 구성하려면 일단 비대위 구성안이 상임전국위를 통과해야 하지만 상임전국위에 친박계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친박계의 ‘맏형’으로 불리는 서청원 의원은 인명진 비대위원장에 대해 “성직자는 사람을 살게 해주는 건데, 죽음을 강요하는 성직자는 그분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너무 많이 사람을 무시했다”면서 “나보고 ‘썩은 종양이다’, 그런 심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성직자를 신뢰해서 성직자를 모셨는데. 인분 얘기를 하고, 할복하라고 하고, 악성종양이란 말을 했다. 잘못 모셔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목사 출신인 인 비대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정치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교회더라. 당인 줄 알았는데 성직자를 구하는 교회”라고 비꼬았다.
또 “이 당이 서청원 집사님이 계신 교회이다.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성직자로 구했더라”면서 “나는 교회를 은퇴했고, 은퇴 목사는 교회를 다시 가면 안 되니까 내가 잘못왔다는 생각을 했다”고 꼬집었다.
이는 자신은 성직자로서 새누리당 ‘임시 대표’를 맡게 된 게 아니라 이제 정치인으로서 영입된 것임을 강조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인 비대위원장은 또 이날 “집사람이 ‘당신은 입이 헤픈 게 문제다. 웬만한 사람만 보면 훌륭한 사람이다. 대통령감, 국회의장감이라고 덕담하는데, 혹시 착각해서 진담으로 알아듣고 나중에 안 되면 거짓말쟁이라고 그럴지 모르니까 입 좀 꼭 다물고 덕담이라도 하지 말라’는 잔소리를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는 서 의원이 “인 비대위원장이 복당 후 국회의장 보장한다고 했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