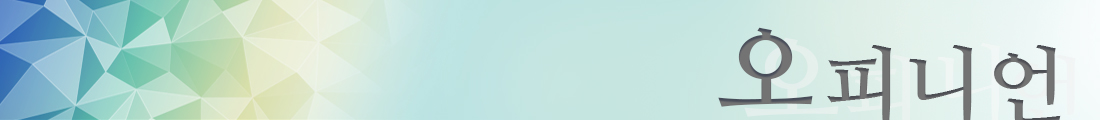법정 최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위원회 산하 고용노동소위가 최근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원칙적으로 합의 했다. 핵심은 휴일근로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연장근로의 한 형태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만 인정한다. 휴일근로는 정부의 행정해석으로 토·일요일 각 8시간씩 16시간까지 허용된다. 소위 합의안대로 법이 고쳐지면 토·일요일을 포함해 한주 7일 동안 12시간의 연장근로만 할 수 있다. 2015년 현재 한국의 노동자 1인당 근로시간은 연간 211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776시간)보다 18.9% 많다. 현 정부는 출범 전 인수위 단계에서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을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올해 들어서는 시행 시기와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허용 여부를 놓고 대립했다.
경제단체들은 국회가 마련 중인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청년실업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는 구인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이론상 줄어드는 근로시간만큼을 담당할 인력에 대한 고용이 필요하게 된다. 그만큼 일자리가 추가로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경제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미 많은 대기업이 주간 52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데다 그렇지 않은 대기업도 고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법안의 통과로 직격탄을 맞는 곳은 중소기업들이다. 대기업과 서비스업종을 원하는 청년들의 취업 선호도가 바뀌지 않는 한, 중소기업은 법 개정으로 구인난 심화와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란 이중고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런 중소기업의 실정을 고려해 근로시간 단축에는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의 기업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 법안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상시근로자 1천 명 이상은 2018년, 300∼999명은 2019년부터 시행하되, 100∼299명은 2020년, 50∼99명은 2022년, 20∼49명은 2023년, 20명 미만은 2024년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 주7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정하는 데 대해서는 노사합의가 있으면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가해서 총 60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대기업도 근로기준법 개정에 우려감을 나타내기는 마찬가지다.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연장근로 수당의 가산금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국회 소위 내에서 이견이 있다고 한다. 그동안 기업들은 정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토·일요일 근로에 대해 평일 연장근로와 같은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했다. 하지만 토·일요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얹어 줘야 한다는 1·2심 법원 판결이 축적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법안 통과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하지만 경영계의 반발 등을 볼 때 법제화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듯하다. 시한을 정해 놓고 무리하게 밀어붙일 이유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