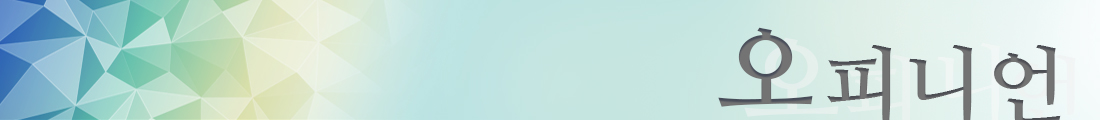다음 달 2일 실시되는 부산시 교육감 보궐 선거가 ‘예상대로’ 진영 대결로 펼쳐지게 됐다. 부산시 교육감을 두고 벌어질 진영 대결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하윤수 전 교육감이 중도 보수 후보들과 단일화에 성공해 진보 후보를 꺾은 데서 온 학습 효과의 영향이 크다.
또 지난해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확인된 교육감 선거 승리 공식인 ‘진영 단일화’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보수와 진보의 극한 대결의 낙수 효과를 교육감 선거에까지 연결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단일화에 내포된 정치 공학
양 진영의 단일화 과정은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이합집산의 정치 공학과 비슷하다. 부산 교육감 선거전은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 검증보다 진영끼리 뭉치는 방법만 강조되고 있다.
후보끼리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장도 없으니,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교육 철학을 평가할 수도 없다. 지역 케이블 방송이 후보들을 초청해 공약을 설명했던 게 그나마 후보들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아무리 좋은 공약과 실천 방법을 제시한 후보라도 인지도에서 밀리면 여론 조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구조에서 보수 진영의 단일 후보가 결정됐다.
2006년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 자치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한국 교육의 아킬레스건인 경쟁 교육 해소에 직선으로 뽑힌 교육감의 정책은 별무신통이었다. 교육 자치가 실시됐어도 경쟁 교육에서 비롯된 학교 폭력, 교권 침해, 학교 밖 청소년 등 한국 교육의 어두운 면이 더 부각됐다.
●러닝 메이트제, 임명제 등 대안 찾아야
‘부산의 교육 대통령’이라 불릴만큼 막중한 권한을 가진 부산의 교육 수장의 선출 기준이 진영 대결로 이어진다면 한국 교육의 미래는 암울하다. 진영만 강조하며 오십보백보인 교육 정책을 제시하는 진보, 보수 후보 가운데 누구를 뽑는 다 해도 한국 교육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지금의 교육감 직선제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 만하지 말고 대안을 찾는 데 공을 들여야 한다. 직선제를 유지한다면 나타난 문제를 보완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러닝메이트제나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 수장이 교육감을 임명하는 임명제로 나가야 한다는 등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보수 진영의 1차 단일화 후보가 된 정승윤 후보는 이번 교육감 선거를 “체제 전쟁”이라고 규정했다. 교육을 진영 싸움의 도구로 삼겠다는 것이다. 교육을 꼭 체제를 옹호하는 수단으로 삼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부산시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본령 구현 대신 진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후진적인 선거다.
[전국매일신문 기고] 이종승 동명대 초빙교수